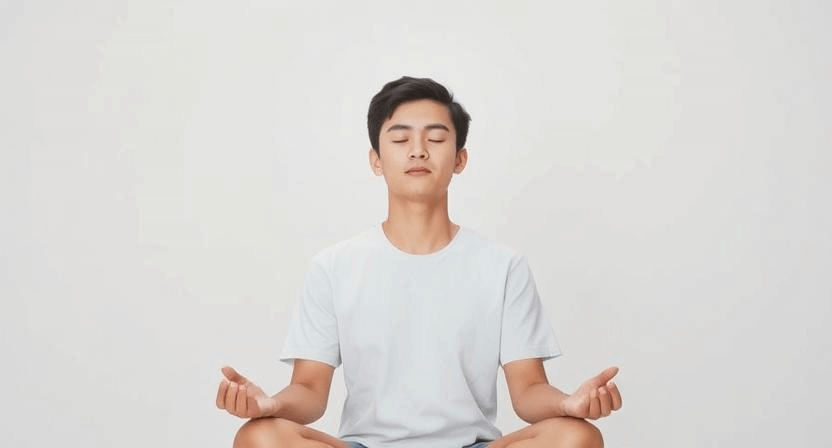
현대의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강렬한 감정 기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 기법과 이론적 배경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이하 BPD) 환자들은 불안정한 감정 상태와 자기상,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인 상담이나 치료 기법만으로는 이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모두 다루기에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리학계와 임상 현장에서 점차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이하 DBT)입니다.
DBT는 1990년대 초반에 마샤 리네한(Marsha M. Linehan)에 의해 정립된 치료 방법으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비롯하여 심한 자살 충동, 자해 행동, 그리고 폭넓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DBT는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CBT)에 ‘변증법적’(dialectical) 관점을 접목하여, ‘지금-여기(here-and-now)에서의 수용’과 ‘변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이론적 배경과 핵심 원리를 심도 있게 살펴본 뒤, 마음챙김(Mindfulness), 고통 감내(Distress Tolerance), 정서 조절(Emotion Regulation), 대인관계 효능성(Interpersonal Effectiveness)의 네 가지 기술 요소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계선 성격장애와 DBT의 배경
경계선 성격장애(BPD)는 일반 인구 중 약 1.6%에서 5.9% 정도로 추정되는 흔치 않은 듯하지만 결코 적지 않은 유병률을 보이는 성격장애 유형입니다(미국정신의학회 DSM-5 참조). BPD 환자들은 대개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며, 자아정체감에 대한 혼란과 대인관계의 불안정성을 호소합니다. 과거에는 이들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제한적이었고, 단순한 약물치료나 주 1회 상담만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샤 리네한 박사는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치료, 즉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BPD 환자들의 극단적인 감정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전통적인 CBT 기법만으로는 감정 조절이 어려운 내담자에게 ‘변화하라’는 메시지 자체가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변화’와 ‘수용’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는 변증법(dialectics)의 원리가 도입된 것입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처음에는 BPD 대상 치료로 널리 알려졌으나, 그 효과와 적용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자살 위험이 높은 청소년, 만성 우울증 환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개인 등 다양한 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DBT가 특정 증상 자체만을 다루기보다, 개인의 전반적인 정서 조절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DBT는 BPD 환자의 자해 빈도 및 자살 시도율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입원 치료 기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이 보고되었습니다(Linehan et al., 2006).
더 나아가,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단순히 ‘치료 기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 상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인본주의적 태도가 근간을 이룹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에, DBT는 강렬한 정서적 변동을 겪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줄이고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2. 변증법과 행동주의
변증법적 행동치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DBT는 변증법(dialectics)과 행동주의(behaviorism), 그리고 인지치료의 기법이 결합하여 있습니다. 변증법은 철학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상반되는 두 개념(예: 수용과 변화)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더 높은 수준의 종합을 이루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를 치료 맥락에 적용하면, 내담자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하면서도, “건강하고 보다 적응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됩니다.
행동주의는 인간의 행동이 환경적 요인과 학습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이 행동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서 특정 행동이 어떻게 학습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분석합니다. 예컨대, BPD 환자가 극단적인 자해 행동을 보인다면, 그 행위가 어떤 심리적 혹은 사회적 이득(예: 일시적 긴장 해소, 주변인의 관심 획득)을 주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응적이고 안전한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기에 인지적 기법도 추가됩니다. 예컨대, “나는 아무에게도 가치 없는 존재야”와 같은 부정적 자동사고를 인식하고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통해, 환자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유연하고 현실에 근거하도록 돕습니다. 즉,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는 이러한 변증법, 행동주의, 인지이론을 융합하여, ‘수용’이라는 요소와 ‘변화’라는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치료적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DBT의 특징 중 하나는 ‘수용과 공감’의 태도를 기반으로 한 치료자의 역할입니다. 치료자는 환자의 고통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느끼는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런 다음, 그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변화를 구체적인 훈련과 실습을 통해 안내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환자는 자신을 둘러싼 문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갑니다.
3.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네 가지 핵심 요소
3.1. 마음챙김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4대 기술 요소 중 첫 번째는 ‘마음챙김(Mindfulness)’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기법으로서, 불교의 ‘위빠사나(Vipassana) 명상’ 전통에서 기원하였으나, 현대 심리학에서는 종교적 색채를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연구·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를 포함해 감정적 동요가 심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치솟는 분노, 슬픔, 불안 등에 쉽게 압도되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음챙김 훈련은 이러한 감정 폭풍 속에서 스스로를 한 걸음 물러나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고 인지했을 때, 보통은 그 분노의 감정 자체에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분노가 생겨나는 과정을 ‘감정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으로 바라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감각(심장 박동, 근육 긴장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응시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점차 강도가 약해지거나, 혹은 제3자 시점에서 상황을 보게 되는 인지적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를 DBT에서는 ‘와이즈 마인드(Wise Mind)’라 부르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만을 강조하는 ‘합리적 마음(Rational Mind)’과 감정에 압도되는 ‘감정적 마음(Emotional Mind)’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로운 마음’을 키우는 것이 DBT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마음챙김이 없다면 변증법적 행동치료 과정에서 제시되는 다른 기술 요소들도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만큼, 마음챙김은 DBT의 토대가 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카바트진(Kabat-Zinn)의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훈련은 스트레스 감소뿐 아니라 우울과 불안 증상의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B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들에서도, 꾸준한 마음챙김 연습이 자해 충동이나 분노 폭발 빈도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DBT 프로그램에서는 마음챙김 기법을 주차별 과제로 제시하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연습하도록 장려합니다.
3.2. 고통 감내
두 번째 핵심 기술 요소는 ‘고통 감내(Distress Tolerance)’입니다. 이는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감정을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고, 견뎌내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 과정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나 극단적인 감정 변동을 겪는 사람들은 흔히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할 때, 그로부터 즉각 벗어나기 위해 자해나 약물 남용, 폭발적 분노 표출 등 파괴적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줄이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제시하는 고통 감내 기술은 주로 급성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는 방법과 자기파괴적 충동적 행동을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컨대 ‘급성 스트레스 시 4단계 처치(Stop, Take a step back, Observe, Proceed mindfully)’ 기법은 강렬한 감정을 느꼈을 때, 즉시 멈추고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뒤, 신중하게 다음 행동을 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TIP(Temperature, Intense exercise, Paced breathing,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가 있으며, 이는 신체적 감각 자극을 활용해 단기적으로 큰 감정적 파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게 돕습니다.
고통 감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에서 불쾌하고 힘든 경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후속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감내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내담자가 스스로에게 유익하지 않은 파괴적 행동 대신, 보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통 감내 능력이 향상된 BPD 환자들은 자해 행동의 빈도가 감소하고, 감정적 위기를 맞이했을 때 위기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obins & Chapman, 2004). 따라서 고통 감내는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지향하는 ‘현재 순간에서의 수용’이라는 변증법적 요소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환자가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3.3. 정서 조절
세 번째 핵심 기술 요소는 ‘정서 조절(Emotion Regulation)’입니다. 이는 주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 명명, 그리고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기술 훈련 과정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비롯해 심각한 감정 기복을 보이는 내담자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매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지각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뒤에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훈련이 필요합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정서 조절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감정 인식(emotion identification) 단계에서, 내담자는 지금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었는지를 파악합니다. 둘째, 감정의 기능 이해 단계에서, 해당 감정이 어떤 의미나 기능을 갖는지를 탐색합니다(예: 분노가 나에게 어떤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셋째, 감정 조절 전략 선택 단계에서는 부정적 감정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예컨대 호흡법, 신체 이완법, 인지적 재구조화 등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 전략을 활용해 봄으로써, 상황에 맞는 감정 표현과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정서 조절 훈련은 매우 실천적인 방법론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감정 일기(emotion diary)’를 통해 특정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발생했고, 그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적어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을 적극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내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낸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달라졌을지?” 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정서 조절 능력이 향상되면, 내담자는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 부딪혀도 이전보다 차분하고 주체적인 태도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억압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상황에 맞게 처리하는 역량’이 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최근 국내외 임상 연구에서도 DBT 기반 정서 조절 훈련이 불안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 개선에 기여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3.4. 대인관계 효능성
네 번째 핵심 기술 요소는 ‘대인관계 효능성(Interpersonal Effectiveness)’입니다. 이는 인간관계 상황에서 자기주장, 경계 설정, 친밀감 유지 등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훈련을 포함합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대인관계에서 극단적인 의존성 혹은 극단적인 거부감 표출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갈등 상황에서도 적절한 소통과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대인관계 효능성 모듈에서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합니다. 첫째, ‘상호관계 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얻어내는 법’을 배우는 것(I Want)을 다룹니다. 둘째, ‘상대방과의 관계를 존중하면서도, 내 자신도 존중하는 상호 존중성(Respect)을 유지하는 대화’를 익히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와 한계를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최소화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DBT에서는 ‘DEAR MAN(Describe, Express, Assert, Reinforce, Mindful, Appear confident, Negotiate)’ 기법 같은 체계적인 대인관계 스킬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청해야 하거나, 혹은 갈등 상황에서 내 입장을 전달해야 할 때, 많은 사람이 막연히 감정적으로 쏟아내거나 혹은 너무 수동적으로 참기만 하며 부적응적인 패턴을 반복합니다. 대인관계 효능성 훈련에서는 구체적인 대화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역할극(role-play)을 통해 숙달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당황스럽거나 격앙된 감정이 올라와도 훈련한 대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대인관계 효능성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관계가 심리적 안정성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BPD 환자들은 상대의 반응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동시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해, 극단적 갈등이나 철회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관계 효능성을 높임으로써, 이들은 주변인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삶에서의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DBT의 대인관계 기술은 단순히 표면적인 대화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습득하는 데 핵심적인 통로로 작용합니다.
4. 실제 적용 사례
이제까지 살펴본 마음챙김, 고통 감내, 정서 조절, 대인관계 효능성의 네 가지 기술 요소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응용되는지 간단한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가령, 20대 후반의 여성 A 씨가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A 씨는 종종 심한 감정 기복과 자해 충동을 겪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한 마디에 분노가 폭발하고, 심지어 대인관계에서 약간의 거절만 있어도 극단적인 우울감에 빠져 주변을 ‘전부 끊어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DBT 치료팀은 먼저 A 씨에게 마음챙김 기법을 통해 자기 관찰능력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A 씨는 평소에 호흡 명상, 신체 스캔, 감정 일기 작성 등을 꾸준히 실습하며, “아, 지금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점차 습득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고통 감내 기법을 적용하여 A 씨가 극도로 분노가 치솟거나 자해 충동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안 행동(차가운 물로 손목을 식히기, 잠시 장소를 벗어나 산책하기,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짧은 운동 등)을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A 씨는 ‘충동이 올라왔을 때 즉시 자해를 하는 행동’ 대신, 잠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자신에게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서 조절 모듈에서는 A 씨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그 감정이 나타났을 때 어떤 대안적 사고와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연습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자동사고가 들 때, 실제로 상대방이 그렇게 의도했는지 점검해 보고, 만약 내 해석이 과한 것이라면 스스로 인지적 재구조화를 통해 덜 극단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효능성 훈련을 통해, A 씨는 상사나 동료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구체적인 화법(DEAR MAN)을 연습했습니다. 이를 실제 직장에서 시도해본 결과, 이전처럼 “폭발하거나 완전히 침묵하지 않고, 적절히 내 입장을 표현하고, 갈등이 생겨도 바로 끊어내지 않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기술 요소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마음챙김은 전체적인 치료 과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고통 감내와 정서 조절 기술은 강렬한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방안을 제시하며, 대인관계 효능성은 사회적 관계와 소통 방식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덕분에, DBT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뿐 아니라 다양한 정서·행동적 문제를 겪는 개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뛰어난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5. 결론
지금까지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의 핵심 개념과 네 가지 기술 요소,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DBT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에게 특화된 치료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자해나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 극단적인 정서적 혼란을 겪는 다양한 내담자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DBT가 단순히 “정신적 문제의 억제”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용과 변화’라는 상반된 개념을 균형 있게 담아내면서, 개인의 전반적인 생활 기능과 삶의 의미를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변증법적 행동치료 기법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앱 기반으로 구현하여 치료적 접근성을 더욱 넓히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담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챙김 연습이나 위기 상황용 고통 감내 기술을 실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전통적인 대면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환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면담과 온라인 자원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삭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들이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대인관계에서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방법과 방향은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체험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임상 현장에서 축적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DBT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재입원율 감소, 자해 행동 및 자살 시도 빈도 감소, 그리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치료 전문가들이 DBT의 원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다른 치료 모델과 결합해 새로운 통합 치료법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확장성은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단순히 특정 환자군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임상 범위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학문적 연구는 물론 임상 현장에서 이미 풍부한 실증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도 응용 가능한 치료 접근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용’과 ‘변화’라는 상반된 개념을 조화롭게 다룸으로써, 내담자의 자율성, 자기 효능감, 그리고 대인관계 역량을 골고루 강화해 주는 점이 DBT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참고 사이트
- https://www.knpa.or.kr: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https://www.kcp.or.kr: 한국임상심리학회
- https://www.koreanpsychology.or.kr: 대한심리학회
7. 참고 연구
- Linehan, M.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Guilford Press.
- Linehan, M. M., Armstrong, H. E., Suarez, A., Allmon, D., & Heard, H. L. (1991).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chronically parasuicidal borderline pati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12), 1060-1064.
- Linehan, M. M., Comtois, K. A., Murray, A. M., et al. (2006). Two-yea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nd follow-up of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vs therapy by experts for suicidal behaviors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3(7), 757-766.
- Robins, C. J., & Chapman, A. L. (2004).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Current status, recent development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8(1), 73-89.
- Kabat-Zinn, J. (2003). Mindfulness-based interventions in context: Past, present, and futur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0(2), 144-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