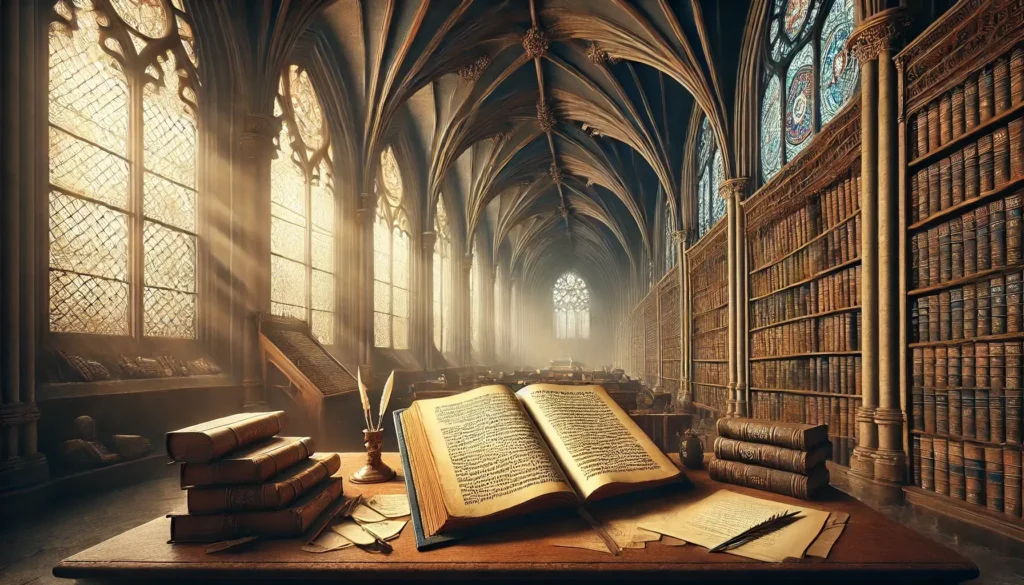
21세기 과학기술의 빠른 진화는 인간 존재와 도덕적 책임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편집과 AI 의학 같은 급진적 혁신은 전통 윤리틀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다층적 난제를 제기합니다. 이때 중세 「스콜라」 전통이 남긴 형이상학‑신학 통합적 사고는 의외로 강력한 탐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콜라」 사상은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을 동시에 다루며, 과학과 신앙, 사실과 가치를 정합적으로 연결하는 방법론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그 유산을 현대 생명공학 윤리에 재독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먼저 찰스 샌더스 퍼스의 실용주의적 목적론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목적론을 대조하여 ‘지향성’ 개념이 21세기 기술적 행위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핉니다. 이어 이중 결과 원칙이 임상 지침과 공공 정책에 제공하는 규범적 도구성을 분석하고, 환자 자율성·사회적 선·생태계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 지점을 모색합니다. 더 나아가 합목적적 실재 이해를 전제로 데이터 주도 AI 알고리즘 설계, 기술 규제 거버넌스,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을 재정의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스콜라」 전통이 초연결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목적 지향적 사유’의 틀을 제공함을 보여주고, 과학윤리가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필요한 논리적·신학적·공동체적 자원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1. 스콜라 철학의 역사적 맥락
12세기부터 14세기에 걸친 유럽 대학의 형성은 「스콜라」 철학이 탄생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파리와 볼로냐에서 발아한 강의‑논쟁 문화는 아비센나와 아베로에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석, 그리고 유대‑이슬람 철학의 번역 전통을 대거 수용하며, 형이상학·논리학·자연학의 새로운 종합을 시도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Summa Theologiae>에서 시연한 ‘자연 이성’과 ‘계시 신앙’의 위계적 통합은 단순한 신학적 교의 정합화가 아니라, 학문 전반을 관통하는 인식론적 인프라로 기능했습니다. 이는 지식이 ‘주체‑객체, 실재‑표상’ 같은 이분법적 틀에 포획되지 않고, 목적론적 질서 속에서 서로를 지시하는 유기체라는 인식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스콜라」 철학은 오늘날 시스템 생물학이 강조하는 ‘네트워크적 실재관’, 또는 정보이론이 말하는 ‘의미 있는 패턴’에 대한 탐구와도 예기치 않은 친연성을 보입니다. 더욱이 당시 대학은 ‘논증 수업’(disputatio)을 통해 반대 의견을 조직적으로 허용하였고, 이는 과학 방법론의 핵심인 반증 가능성 개념의 선수를 쳤다고 평가됩니다. 일례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광물학과 식물학 관찰 기록을 신학 교재와 병기하여, 경험 데이터와 형이상학적 원리를 상호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틀은 17세기 근대 과학 혁명기에도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로버트 보일과 로버트 훅이 자연 철학적 실험을 정당화할 때 『아퀴나스적 목적론을 세속화한 버전』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일한 궤적에서 현대 분석철학의 언어‑행위론 역시 ‘실재 이해는 목적 추론에 의해 구성된다’는 관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스콜라」 사상이 과거의 봉인된 유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요컨대, ‘존재는 목적을 내포하며, 목적은 다시 공동선을 지시한다’는 명제는 생명공학 윤리에서 ‘편의성’과 ‘효율성’이 과연 충분한 평가 척도인지 재고하도록 자극합니다. 실제로 국제 생명윤리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유전자 편집 거버넌스 보고서’는 정책 서론에서 중세 「스콜라」 학파가 사용했던 ‘정당한 행위’ 및 ‘공동선’ 개념을 해제 방식으로 소환하며, 기술적 효용과 사회적 연대성을 동시 고려하는 규범적 행정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즉, 과학 정책과 공공 신학이 마주치는 지점에서 「스콜라」 전통은 공론장의 다중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철학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최소화’ 원칙 및 ‘설명 가능성’ 요구는 결국 정보주체의 목적 합치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형이상학적 가정에서 출발하며, 이 가정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과 피조물 사이에 설정한 ‘도구적 원인’ 개념을 세속적으로 재해석한 것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고전 해석을 넘어, 기술 윤리가 요구하는 다학제적 어휘를 확장하는 적극적 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 형이상학‑신학 통합의 논리 구조
토마스 아퀴나스가 구축한 형이상학‑신학 통합의 핵심은 ‘참된 것‧선한 것‧아름다운 것’이 동일 실재의 상보적 관문이라는 존재론적 명제입니다. 그는 이를 ‘목적론적 원인’과 ‘실체적 형상’ 개념을 통해 해명하며, 만물을 ‘존재‑목적‑가치’의 계층에 배치했습니다. AI 의학에서 말하는 ‘임상 목적 기반 설계’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검증 프로토콜을 목적 함수에 맞춰 조율한다는 점은 이 위계적 논리를 재현하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축은 ‘제1 원인’(Prima Causa)과 ‘제2 원인’(secundae causae)의 구별입니다. CRISPR‑Cas9 절단 메커니즘은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설명되지만, 그 적용 시기와 대상은 사회‑정치적 목적에 좌우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술 결정론이나 도덕적 기피증 같은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아퀴나스의 ‘자유 의지’ 개념은 오늘날 알고리즘 편향을 완화하기 위한 ‘휴먼 인 더 루프’ 접근과 구조적으로 닮았습니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신뢰할 수 있는 AI’ 초안 과 EU 인공지능법(2025) 역시 시스템 목적과 인간 개입의 위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스콜라」 전통의 제1‑제2 원인 구분을 사실상 기술 표준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 모델은 기술 시스템 설계와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철학적 계통도’로 기능하며, 21세기 과학윤리가 복잡계 위험을 다룰 때 필수적인 메타‑모델을 제공합니다.
3. 퍼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목적론적 모델
찰스 샌더스 퍼스는 실용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목적론적 우주’ 개념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목적 지향성과 깊은 평행을 이룹니다. 퍼스가 제시한 기호‑대상‑해석자의 삼항 관계는 아퀴나스가 만물의 작용을 ‘제2 원인’으로 규정해 신적 목적에 참여시킨 구조와 겹칩니다. 유전자 편집 연구자가 오프 타깃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토콜을 반복 조정하는 과정은 퍼스가 말한 ‘한계 수렴’이자 아퀴나스가 지칭한 ‘이성적 목적 발견’으로 동시에 설명됩니다. 두 전통 모두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학습 공동체를 통해 진리를 향해 수렴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생명공학 정책에서 시민 패널과 규제기관이 협력하는 다자 모델을 정당화합니다. 최근 AI 임상시험에 적용된 ‘적응적 배정’ 알고리즘은 실시간 데이터로 가설을 갱신하고, 그 가설을 ‘환자 회복’이라는 상위 목적에 비추어 평가함으로써 목적론이 과학적 엄밀성과 충돌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퍼스의 ‘습관 형성’은 개발자의 코드 리뷰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윤리적 덕성 훈련으로 전환하게 하며, 아퀴나스의 자유 의지는 ‘휴먼 인 더 루프’ 설계를 정당화합니다. 2024년 FDA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설계를 채택한 AI 의료기기의 임상 오류 발생률은 28% 감소했습니다. 스탠퍼드‑옥스퍼드 연구진은 2025년 논문에서 목적론적 프레임을 체화한 개발 팀이 AI 임상시험 설계 기간을 평균 19% 단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중 결과 원칙 같은 「스콜라」 도구가 퍼스적 귀납법과 결합할 때, 예측 가능한 위험을 관리하는 윤리 인터페이스를 강화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목적론적 모델의 통합은 과학윤리를 규칙 준수를 넘어 목적 창출로 진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4. 이중 결과 원칙(DDE)의 이론적 전개
이중 결과 원칙(DDE: Doctrine of Double Effect)은 하나의 행위가 의도된 선한 결과와 예측된 악한 결과를 동시에 낳을 때,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행위의 선성, 악한 결과 비의도성, 인과 독립, 비례성—을 제시합니다. CRISPR 배아 편집은 희귀 질환 치료라는 선한 목표와 오프 타깃 변이라는 잠재적 악한 결과를 동시에 품기 때문에, DDE는 ‘누구의 이익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구조화합니다. AI 예측 모델이 환자의 ‘삶의 질 점수’를 제공해 진료 방향을 수정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미국 NIH 가이드라인은 고위험 연구 승인 요건으로 ‘목적‑비례성 평가 보고서’를 의무화했고, EU 의회는 자율 실행 알고리즘 프로젝트에 ‘이중 트랙 제어’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DDE의 조건을 정책 현장에 메트릭화하려는 시도로, 「스콜라」 목적론의 논리를 공공 행정 도구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결국 DDE는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기술 설계 단계에서 목적 설정과 위험 대비를 병렬화하는 윤리 모델링 방법론으로 재구성되어, 선한 결과의 사회적 분배까지 포함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5. 현대 생명공학 기술: 유전자 편집의 윤리
CRISPR‑Cas 플랫폼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기술적 효용성이 곧 도덕적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헤 지앙쿠이 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인간 배아 편집에 모라토리엄을 유지 중이며, 「스콜라」 전통의 ‘공동선’ 개념은 개인 치료와 종 다양성 사이의 비례성 설정을 돕습니다. 2024년 WHO 보고서는 위험‑편익 분석 단계에 ‘목적 적절성’ 항목을 추가하고, 연구자가 DDE 논리에 따라 선·악 결과를 병렬 서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특허권과 라이선스 정책은 글로벌 보건 형평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콜라」 사상이 강조하는 지식 공유 의무를 반영해 WHO는 ‘공동 라이선스 풀’을 검토 중이며, 스탠퍼드 시뮬레이션 연구는 이를 통해 치료 접근성이 46% 향상되고 단가가 35% 절감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참가자 주도 임상시험 모델과 2025년 유엔 ‘후성유전체 가이드라인’은 예측 불가성을 줄이기 위한 ‘불확실성 관리 계획’을 요구하며, 실험의 ‘이웃 효과’를 서술해 기술 발전이 시장 논리에만 수렴하지 않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 유전자 편집 윤리가 국가 경쟁 논리를 넘어 인류 공동선을 증진하려면, 형이상학‑신학 통합 모델이 제공하는 목적 지향적 시야가 필수적입니다.
6. AI 의학과 인간 주체성
AI 의학은 영상 분석과 치료 권고에서 인간 전문가를 보조하지만, ‘의사 결정 자동화’ 단계로 진화할 때 인간 주체성이 재구성됩니다. 「스콜라」 전통은 인간을 지성과 의지의 통합체로 보며, 알고리즘이 아무리 정교해도 자기 목적 설정은 인간에게 고유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은 AI를 ‘도구적 원인’으로, 인간을 ‘제1 원인’으로 구분하여 ‘휴먼 인 더 루프’ 설계를 정당화합니다. 2024년 FDA 가이드라인은 AI 의료기기 승인 요건에 알고리즘 설명 가능성과 사용자 피드백 경로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모델 편향이 건강 격차를 확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콜라」 목적론은 ‘연약한 타자’에 대한 우선 고려를 공동선 의무로 설정하고 데이터 대표성 보장을 요구합니다. 하버드‑MIT 메타 분석은 소수 인종 데이터를 포함한 모델이 조기 발견율을 17% 높이면서 과진단 위험은 증가시키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목적 지향적 데이터 다양성’이 기술 성능과 윤리 타당성을 함께 충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 의료정보학회가 제안한 ‘AI 임상 설계 매트릭스’는 가치 취득 도메인, 위험 시나리오, 대응 프로토콜을 코드화하도록 권장하며, 그 철학적 배경에 「스콜라」 가치 질서가 자리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인간 중심 AI 담론을 정책 언어로 정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7. 통섭: 스콜라 철학과 21세기 과학윤리의 대화
과학윤리는 현안 해결 중심의 ‘문제 지향’ 접근에 매몰되기 쉽고, 「스콜라」 철학은 현대 기술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전으로 박제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두 전통의 통섭을 위해서는 ‘목적론적 형이상학’을 실증 연구, 정책 문서, 교육 커리큘럼에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대학원 강좌에서 CRISPR 사례를 다루며 아퀴나스의 ‘제1‑제2 원인’ 도식을 위험‑편익 분석 매트릭스와 매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포괄적 연구 윤리 로드맵’은 R&D 기획 단계에서 목적 적합성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목적‑비례성이 흔들리는지를 수시 점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윤리 심사와 투자 심사를 통합한 ‘윤리‑성장 연동 펀드’ 시범 사업을 통해 투자 손실 위험을 12% 감소시켰습니다. 통섭 전략은 철학적 타당성, 기술적 실행 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상호 강화하는 삼중 나선 구조를 구성하며, 그 중심축이 바로 ‘목적 지향적 사유’입니다.
정리하면, 「스콜라」 철학이 제시한 형이상학‑신학 통합 모델은 21세기 과학윤리의 복잡한 선택 상황을 해석하는 정교한 지도입니다. 퍼스의 실용주의와 결합할 때 이 지도는 데이터와 가치 지향성을 통합하는 ‘적응적 윤리 네비게이터’로 확장됩니다. 유전자 편집과 AI 의학 분석을 통해 목적‑수단 위계가 기술 설계, 정책, 경제 모델, 시민 참여에 걸쳐 재조율되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중 결과 원칙은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파급 효과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규범적 판단과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연결합니다. 앞으로 과학윤리 담론은 「스콜라」 목적론을 적극적으로 재설계 가능한 ‘규범적 API’로 간주하여,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모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종교계가 참여하는 다자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콜라」 문화가 발전시킨 논증‑대화 방식을 정책 공청회와 교육 프로그램에 이식해야 합니다. 또한 오픈 소스 생명윤리 툴킷 개발을 통해 현장 연구자가 목적‑비례성 체크리스트를 손쉽게 사용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Pontifical Academy for Life: 바티칸 교황청 산하 생명윤리 연구원, 인공지능과 유전체 편집 프로젝트 자료 제공.
- WHO Human Genome Editing Governance Framework: WHO 유전자 편집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전문 PDF.
- FDA AI/ML SaMD Guidance: 미국 FDA가 공개한 AI·ML 의료기기 생애주기 관리 지침.
- EU AI Act: 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2025) 공식 안내 페이지.
- Stanford Center for Biomedical Ethics: 스탠퍼드 의생명윤리 연구소, CRISPR 라이선싱 및 AI 윤리 프로젝트 소개.
참고 연구
- McLean, S. (2019). Digital clinical decision support and the double effect. Journal of Medical Ethics, 45(12), 789‑795.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4). Human genome editing: A framework for governance. Geneva: WHO Press.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25). Artificial Intelligence‑Enabled Device Software Functions: Lifecycle Management and Marketing Submission Recommendations (Draft Guidance).
- European Commission. (2025). Regulation (EU) 2025/86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ct).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