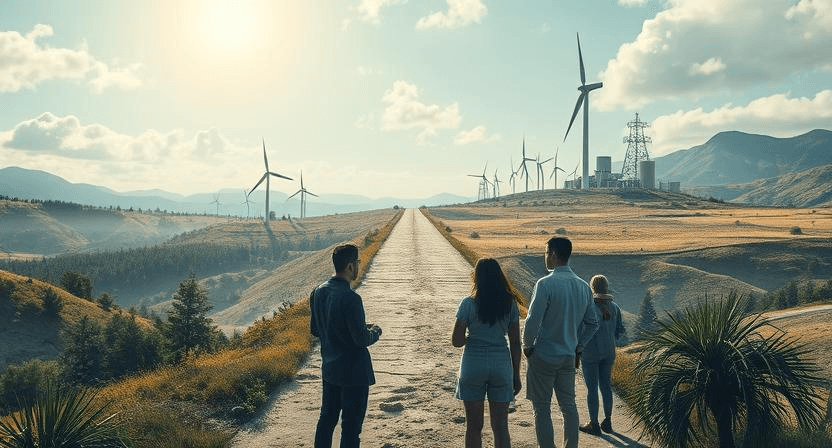
디지털·생명·에너지 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현재, 인류는 전례 없는 번영과 함께 파국적 잠재성을 품고 있습니다.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 한스 요나스가 1979년 발표한 『Das Prinzip Verantwortung』은 이러한 딜레마를 간파하며 책임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책임의 원칙은 “당신의 행위가 지구상의 미래 생명 조건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라”는 확장된 의무 명령으로, 기존 윤리학이 고려하지 못한 장기적·전지구적 결과를 평가 척도로 삼습니다. 본 글은 환경 파괴, 유전자 조작, 인공지능 설계 등 현대 기술 환경 속에서 한스 요나스 사상의 의의를 분석하고, 선한 의도와 장기적 결과를 대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윤리적 행동 지침을 모색합니다.
1. 현대 기술 진보와 윤리적 도전
1.1. 가속화된 과학기술과 환경 파괴
산업혁명 이래 인간은 화석연료와 대량 생산 기술을 통해 GDP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그러나 대기 중 CO₂ 농도는 산업화 이전 280 ppm에서 2024년 425 ppm으로 치솟아 지구 평균 기온을 1.2 °C 끌어올렸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4년 세계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비중은 33 %에 불과하며, 매년 20억 톤 이상의 신규 CO₂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기후 시스템의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어설 위험이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책임의 원칙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예견할 때, 무지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가르침을 통해 정책·투자 결정자가 비관적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도록 압박합니다.
미세먼지·오존·초미세 플라스틱 등 복합 오염원이 인체 대사·호흡·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발표 논문은 미세플라스틱이 인간 폐포 조직에 침착될 경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2.3배 증가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책임의 원칙은 가정법적 예방(precautionary action)을 촉구하며, 정보 부족을 규제 완화의 논거로 삼지 못하게 합니다.
1.2. 유전자 조작과 생명권 논쟁
CRISPR-Cas9 플랫폼은 2012년 이후 생물학 실험실의 표준 도구가 되었고, 2023년 전체 SCI(E) 논문 중 ‘CRISPR’ 키워드가 포함된 비중은 1.4 %에 달합니다. 유전자치료 임상시험 수는 같은 해 298건으로 집계돼 불과 5년 만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배아 단계에서의 영구적 변형은 생태·사회 시스템에 복합적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원칙은 “선행(善行)이 미래 세대를 위험에 노출시킬 때, 그 선행은 정지돼야 한다”는 윤리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장애 치료라는 선한 의도가 불확실한 장기 효과를 가리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드라이브 실험에 참여한 생물학자들은 흔히 ‘통제된 실험실 환경’이라는 방패막으로 책임을 한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생태계는 개방계(open system)이기 때문에 단일 탈출 사건이 종(種) 수준의 대멸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계적 상호의존성이 큰 영역에서는 책임의 원칙이 과학적 확실성보다 도덕적 상상력을 우선하도록 요구합니다.
2.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 개관
2.1.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
칸트의 의무론은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형식 기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간 기술이 행성 규모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책임의 원칙은 인간 행위가 자연계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s) 자체를 변형하는 시대에는 의무의 보편화가 아닌 ‘존재-가능성(preserve the ability to be)’이 최우선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래 세대를 향한 의무는 단순 선물 개념이 아니라, 현세대의 존재 조건 그 자체를 성립시키는 자기참조적 명제라는 점에서 윤리적 급진성을 띱니다.
요나스 철학의 핵심 기둥은 ‘존재론적 긴장(ontological tension)’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동시에 육체적·생태적 조건에 구속됩니다. 이 모순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술 만능주의 또는 반(反)기술 근본주의로 기울기 쉽습니다. 책임의 원칙은 자유와 구속의 상호의존성을 전제하며, 자유가 커질수록 책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한다고 규정합니다.
‘공포의 휴리스틱’은 무조건적 공포 정치가 아닙니다. 요나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파국 가능성을 상상하고, 그 감정적 체험을 통해 적극적 예방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022년 Nature Climate Change 메타분석은 기후위기 관련 공포 메시지가 행동 변화를 유발할 때, 개인 효능감 정보가 결합되어야 효과가 지속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책임의 원칙이 두려움과 실천 가능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2.2. 선한 의도보다 장기적 결과
윤리학사(史)에서 동기 중심 패러다임과 결과 중심 패러다임의 싸움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분열 이후 ‘결과’의 범주는 인류 절멸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이는 질적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책임의 원칙은 동기와 결과를 이분화하지 않고, 행위자가 결과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확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때 ‘가능한 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임계 사례 방법(critical case method)이 윤리 검증 수단으로 도입됩니다.
AI 시스템 설계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2024년 발생한 대형 언어 모델 환각(hallucination) 기반 의료오진 사건은 데이터 편향과 과신이 결합할 때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책임의 원칙은 설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거시적 책임을 묻고, 블랙박스 모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임상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윤리적 정지를 촉구합니다.
한스 요나스의 사상적 뿌리는 현상학과 실존철학에 있습니다. 그는 스승 하이데거로부터 존재론적 물음을 계승했지만, 나치 부역 사상을 보며 ‘철학은 행위의 나침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1943년 팔레스타인 전선에서 복무하던 그는 전쟁 체험을 통해 인간이 기술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쉽게 ‘도구화된 폭력’이 되는지를 목도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책임의 원칙』에 “행위자는 이제 자연의 경계 너머로 영향력을 확장했고, 그 결과까지 견뎌낼 도덕적 준비가 요구된다”는 선언으로 승화됩니다.
끝으로, 한스 요나스 사상의 현대적 재해석은 데이터 윤리와 로봇윤리 분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베를린 공대 철학과 연구진은 2024년 ‘책임 by Design’ 프로젝트를 출범하여,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이 도로 위 취약사용자를 우선 보호하도록 설계하게 하는 프로토타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술 규범을 코드 수준에 내장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문헌 연구뿐 아니라 인터뷰, 참여 관찰 등 질적 방법을 통해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3. 책임의 원칙과 환경 윤리
3.1. 기후변화와 윤리적 재구성
2023년 UAE 두바이에서 열린 UN COP28 정상회의는 ‘화석연료 단계적 감축’이라는 표현을 최종문서에 포함했으나, 법적 구속력은 부재했습니다. 다수 선진국은 2050 넷제로 목표를 선언했지만, 국제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SETIS)는 현재 정책 속도로는 2 °C 시나리오에 필요한 연간 재생에너지 투자액의 40 %만 달성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투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의 원칙은 탄소예산(carbon budget)의 윤리적 분할을 제안하며, ‘방출 권리’ 대신 ‘보전 의무’ 담론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합니다.
도시 설계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도쿄도는 2025년부터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반발에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책임의 원칙을 핵심 윤리 근거로 제시한 시민 포럼 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철학적 논의가 도시 환경 정책에 구체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2030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가 30 × 30 목표(육상·해양의 30 % 보호)를 채택했습니다. 책임의 원칙은 종(種)의 생존 권리를 인간 중심 이익 구조 너머의 독자적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함으로써, 보호구역 설정과 토지 이용 계획에서 생태계 보전이 ‘선택적 선행’이 아닌 ‘의무’임을 분명히 합니다.
3.2. 원칙 적용 사례: 플라스틱 오염
세계플라스틱협회(WPC)의 2024년 보고는 2050년 플라스틱 생산량이 9억 톤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 생산 패턴을 유지할 경우 해양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진다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책임의 원칙은 생산자를 ‘후천적 잠재 가해자’로 규정하며, 확정적 피해(foreseeable damage)를 예방하기 위한 원료 단계 책임이행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르웨이는 2024년 북해 대륙붕에서 회수된 폐어망으로부터 6만 톤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운영진은 보고서 첫머리에 책임의 원칙을 명시하며 “기술에 의해 생성된 폐기물은 기술적·윤리적으로 그 창조자가 회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오염자 부담’ 논리를 윤리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례입니다.
국제협력 차원에서는 2024년 파리 회의에서 ‘UN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초안이 채택되어 2027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플라스틱 원료 생산 상한선 설정, 제품 내 재활용 소재 최소비율 의무화, 국가별 감축 목표 보고를 포함하며, 조약 전문(前文)에는 책임의 원칙이 공식 인용되었습니다.
해양 분야에서도 기술혁신과 규제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서양 연안국은 ‘자율 운항 선박’ 도입을 앞두고 연료전환·충돌방지·해양보호구역 준수 등 복합 의무를 정의하는 공동 가이드라인을 2024년에 의결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박의 실시간 배출량과 항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해 투명성과 사후 추적가능성을 보장하며, 위반 시 자동으로 벌금이 청구되도록 프로그래밍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거버넌스 실험은 대규모 물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하려는 글로벌 시도의 일환입니다.
육상 운송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수명 종료 후의 2차 활용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용 후 EV 배터리를 계통저장장치로 재사용하는 사업모델을 정식 허가했으며, 배터리 여력(SoH) 평가 알고리즘을 국제 표준화 기구(IEC)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제품-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된 사례는 잔존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원재료 채굴을 억제해 탄소 배출을 줄임과 동시에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4. 책임의 원칙과 생명공학
4.1. CRISPR 기술과 윤리적 교차점
‘디자이너 베이비’ 담론은 2018년 중국 남방과학기술대 학계 규범 위반 사건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과학계는 자율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했지만, 2024년 미국 MIT 연구진이 배아 단계 면역 병증 제거 실험을 진행하면서 논쟁은 재점화되었습니다. 책임의 원칙은 이런 고위험 연구에서 ‘윤리적 과학기술 영향 평가’(eTAF)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4.1.1. 위험과 불확실성
배아 편집이 전세대까지 유전될 경우 잠재적 부작용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WHO는 2021년 권고에서 편집된 인간의 출생을 전면 유예하되, 기초 연구는 엄격한 승인제하에 허용했습니다. 이는 책임의 원칙이 이론적 선언에서 정책적 조치로 전환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모니터링 지속기간을 단일 세대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책임 실현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4.2. 합성생물학과 윤리적 적용
합성생물학은 2024년 기준 글로벌 시장 규모 300억 달러, 연평균 성장률 23 %로 추정됩니다. 바이오연료에서 대체육까지 응용 분야가 폭넓지만, 합성 미생물의 통제 불능 확산은 생태 시스템의 균형을 붕괴시킬 위험을 내포합니다. 책임의 원칙은 안전 스위치, 유전자 킬 스위치, 생물학적 격리장치 등을 ‘디폴트 설계’로 채택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혁신가에게 사후 책임뿐 아니라 사전 책임을 부과합니다.
2023년 캐나다 몬트리올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Open Gene Code’ 프로젝트는 DIY 바이오커뮤니티가 합성 유전자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WHO R&D 블루프린트는 생물학 테러 악용 가능성을 경고하며 책임의 원칙에 기반한 접근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방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책임 담론이 실질적 지침을 제공함을 보여줍니다.
생명공학 분야 전문가들은 ISO 22789(2023) ‘통합 바이오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이 위험 매트릭스를 산업 표준화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실험 규모, 생물학적 독성, 전파력, 환경 지속성을 변수로 삼아 5등급 위험 지수를 산출합니다. 해당 지수는 연구비 지원, 국제 공동연구 승인 절차, 보험료 납부까지 연동되어 실질적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규범적 조치를 결합해 기술 발전을 ‘관리된 속도’로 유도하려는 새로운 규제 철학의 실험장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한국에서는 ‘생명공학 안전관리 강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연구자가 잠재적 생태리스크를 서면 진술하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책임의 원칙을 국가 연구재정 배분의 조건으로 사용한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 ‘선한 의도’ 대 ‘장기적 결과’ 비교
5.1. 선의의 한계
1950년대 영국에서는 곰팡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DDT 살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낮은 살충제로 생존한 해충이 내성을 획득했고, 먹이사슬 최상위종인 맹금류의 알 껍질이 얇아져 개체 수가 급감했습니다. 책임의 원칙 관점에서 볼 때, 선의로 시작된 방제 프로젝트는 장기적 생태 균열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실패했습니다.
5.2. 결과 지향적 윤리의 필요성
행동 경제학에서 ‘확률할인(probability discounting)’ 편향은 드문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팬데믹 이전 세계은행 보고서(2019)는 전염병으로 인한 연평균 GDP 손실 가능성을 0.1 %로 산정했으나, COVID-19는 2020년 단일 연도에 세계 GDP를 3.4 % 하락시켰습니다. 책임의 원칙은 저확률·고위험 이벤트를 계량화할 때, ‘기하평균 손실’이 아닌 ‘최악의 누적 손실’을 기준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교정합니다.
5.3. 행동 경제학과 의사결정 편향
시간할인율(time discounting)이 높은 개인은 연금 적립보다 즉시 소비를 선호하고, 정부는 임기 내 성과에 집중해 장기 과제를 회피합니다. 이런 구조적 편향을 상쇄하려면 제도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영국의 ‘탄소예산위원회’는 5년 단위 탄소예산을 법적으로 할당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감축 목표가 누적 유지되도록 합니다. 책임의 원칙은 이러한 기구 설계에서 ‘장기적 결과 우선권’을 부여하는 헌법적 장치를 정당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 분석(framework analysis)을 통해 장기적 결과가 사회 각집단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예컨대 해상풍력 단지는 전 지구적 탄소 감축 목표에 기여하지만, 어민에게는 어장 축소라는 즉시적 비용을 전가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tragedy of the commons를 피하려면 보상·참여·정보 공개를 엮은 다층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분배 분석은 책임의 원칙을 실천 계획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실증 자료를 제공합니다.
6. 정책 및 산업계 적용 방안
6.1. 예비적 대응(Precautionary Approach)
EU REACH 규정은 2018년부터 나노물질에 대한 특수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나노입자는 크기가 작아 독성 경로가 기존 규제 모델과 달라질 수 있기에, 책임의 원칙은 규제 비대칭성을 인정하고 실험실·환경노출·폐기 전 주기 데이터 축적을 요구합니다.
6.2. 지속 가능성 보고 의무화
금융 분야에서는 IFRS SASB가 2025년부터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기업은 제품 수명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 위험을 정량화하고, 완화 전략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와 소비자가 책임의 원칙을 시장 언어로 해석하여 리스크 프리미엄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6.3. 윤리적 기술 설계(ETD)
노르웨이선급(DNV)은 2024년 ‘AI 사이버물리 시스템 안전지침’을 발표하며, 위험 분석 단계에 ‘윤리적 설계 검증지수(ET-Index)’를 도입했습니다.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개발 프로세스 전면 중단을 권고하는데, 그 철학적 배경이 책임의 원칙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윤리 지수가 실질적 예산·일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례로 기록됩니다.
6.4. 순환경제 인센티브
EU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초안은 2026년부터 모든 대형 가전제품에 ‘수리 용이성 지수’를 라벨링하도록 요구합니다. 소비자가 고장 시 교체보다 수리를 선택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조사는 부품 모듈화를 통해 수리 시간을 단축하고, 제품의 65 %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구성해야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원 추출량을 줄이고 폐기물 흐름을 선순환시키려는 정책 의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책임의 원칙은 기술 시스템이 “자기 폐기물을 자기 책임으로 회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윤리적 교리로 강조하며, 순환경제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한편 탈탄소 전환 금융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시장 메커니즘의 하이브리드 전략이 요구됩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24년 ‘녹색 예금 준비금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은행이 녹색 프로젝트 대출을 확대할수록 지급준비금 요건을 완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초기 분석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평균 45bp 낮아졌고, 신생 청정기술 기업의 자본조달 창구가 다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기후리스크를 금융리스크로 재인식함으로써, 중앙은행이 수단적 중립성을 넘어 지속 가능성 의제를 직접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ESG 데이터 검증 간의 미스매치는 ‘그린워싱’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AI 기반 지속가능성 등급 평가 알고리즘을 심사하는 ‘신뢰성 레이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훈련데이터 출처, 편향 제거 절차, 설명 가능성 지표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같은 투명성 강화는 투자자가 허위 친환경 주장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며, 실질적 탄소 감축 프로젝트로 자본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는 ‘탄소 국경조정(CBAM)’이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고탄소 상품은 EU 역내에서 소비될 때, 범(汎)역외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한 관세가 부과됩니다. 국제무역기구 규범과 충돌 여부가 논의되고 있지만, 다수 법학자는 CBAM이 전통적 관세가 아닌 환경 규제 조치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 제도는 수출 기업에게 배출권 거래제와 동일한 회계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7. 결론
인류는 기술로 자연계의 경계선을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작성 능력이 곧 자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의 원칙은 모든 혁신행위자가 “존재 그 자체의 조건을 안전하게 보존하라”는 명령을 공유할 때만, 기술과 생태가 공존하는 미지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과적으로 철학적 성찰은 정책과 산업 설계의 사치가 아니라 생존 조건입니다.
기술에 대한 통제력은 인간 지능과 윤리적 상상력의 결합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책임의 원칙을 교육 커리큘럼, 기업 거버넌스, 국제조약 조문에 통합함으로써, 선한 의도를 넘어 장기적 결과를 중심에 둔 윤리 문명을 구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로컬 커뮤니티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덴마크 사민주의 모델은 지방정부가 풍력 발전소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전체에게 배당형 지분을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과 환경 부담을 공유합니다. 이 과정은 공공선과 개인선 간 갈등을 줄이고, 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협력적 미래 계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아가 문화 교육 차원에서 대학 교양 과정에 환경·기술 윤리 필수 과목을 편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2025년부터 서울 소재 주요 대학 4곳은 ‘지속 가능성과 책임의 원칙’이라는 공동 교과목을 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의는 철학·경제·공학·디자인 교수진이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하며, 수강생은 실제 지역 사회 프로젝트를 수행해 책임의 원칙을 체험형 학습으로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는 철학적 담론을 교실 밖 현실 문제 해결로 연결하려는 실천적 교육 모델입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부: 대한민국 환경 정책과 통계를 제공하며, 기후 및 자원순환 관련 최신 입법 동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 연구·윤리·정책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한스 요나스 및 환경철학 항목 등 심층적인 학술 해설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IPCC: 기후변화 과학적 평가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 환경 리스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HO: 인간 유전자 편집 및 공중보건 지침을 포함한 바이오안전 자료를 제공합니다.
참고 연구
- Jonas, H. (1979).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die technologische Zivilisation. Frankfurt am Main: Insel Verlag.
- Jonas, H. (1984). The Imperative of Responsibility: In Search of an Ethics for the Technological Ag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oudna, J. A., & Charpentier, E. (2014). The new frontier of genome engineering with CRISPR-Cas9. Science, 346(6213), 1258096. https://doi.org/10.1126/science.1258096
- IPCC. (2021). Sixth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2021. Geneva: IPCC.
- WHO Expert Advisory Committee on Human Genome Editing. (2021). Human genome editing: Recommendation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